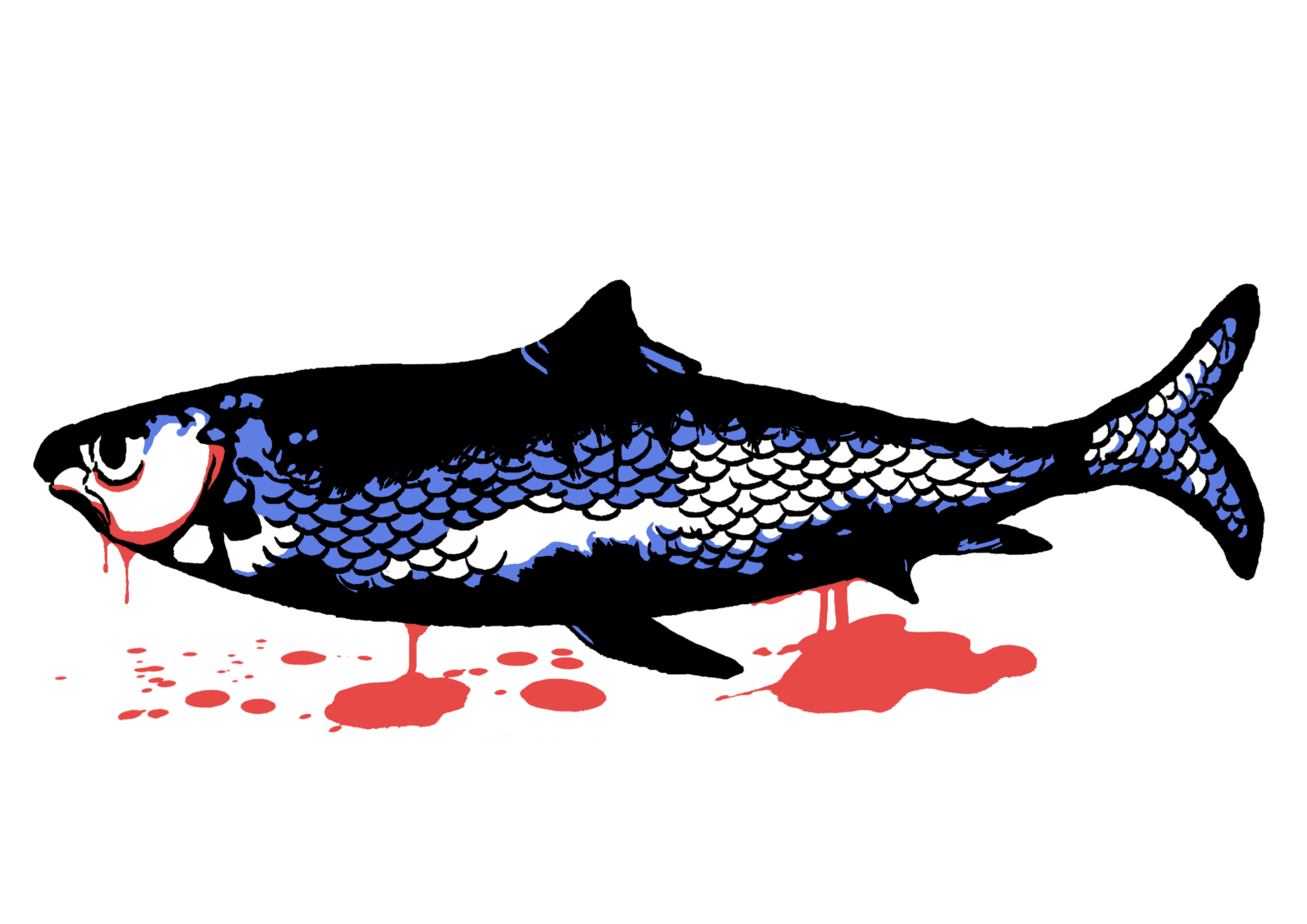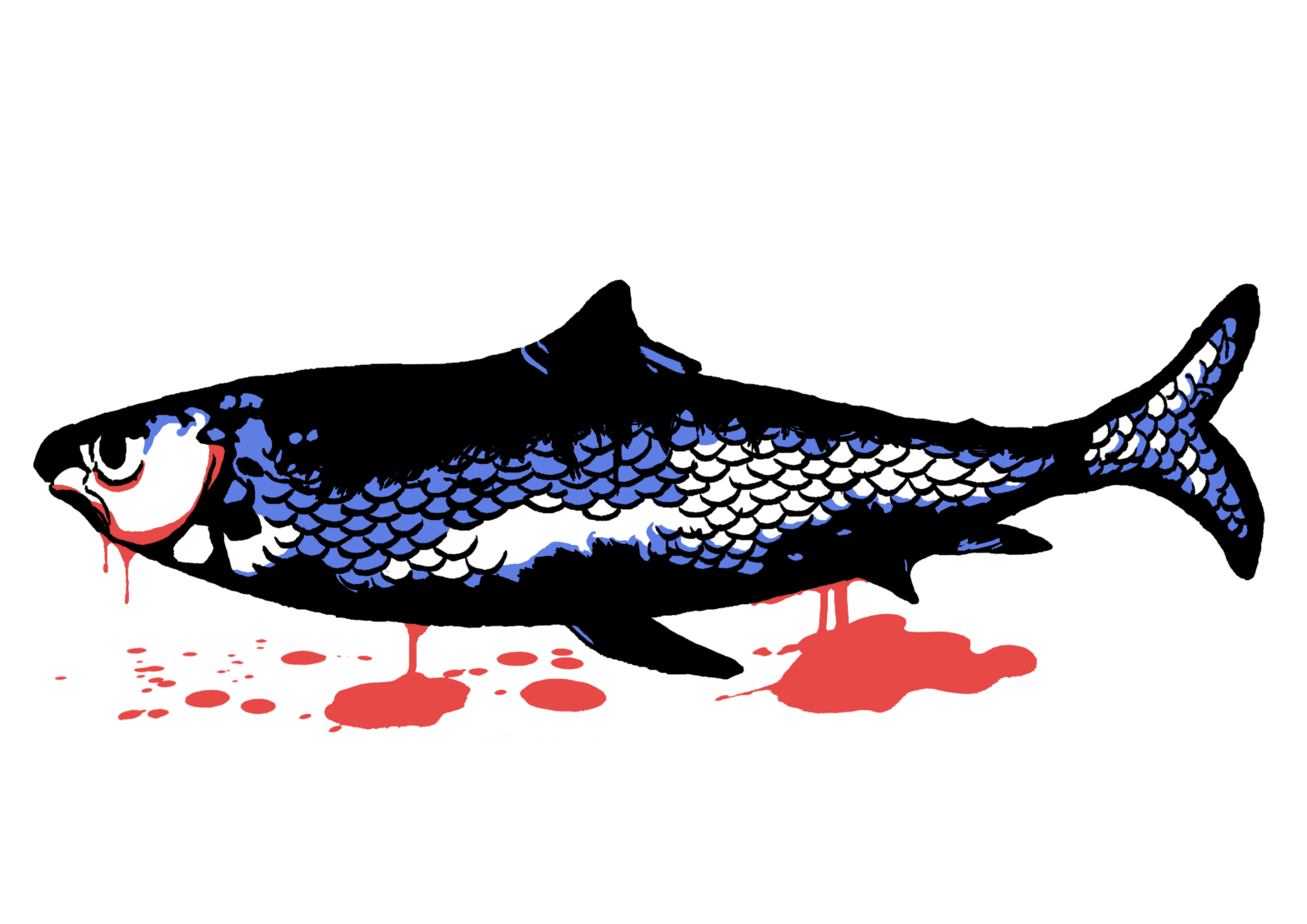
x. 헬로, 미스터 서울
‘되도록이면 쓰지 말아야 한다.’
코트 안 쪽에 만원짜리 한 장 쑤셔 넣은 채 거리로 나왔다. 그깟 만원짜리 한 장이라 생각하고 써버렸다간 일주일간 식사시간은 고역이 될 것이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써야 한다는 것을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스스로에게 각인시켰다. 최대한 아껴야만 하는 상황에서 교통카드에 3000원 가량이 남아있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면서 지하철 역 쪽으로 걷는 동안에도 최소 환승 경로를 찾기 위해 머리 속으로는 어지러운 지하철 노선도를 떠올렸다. 잠시 쇼윈도 너머로 보인 뉴스에서 이상기후라 떠들었다. 정말 매스꺼운 뉴스가 아닐수가 없다. 매일 같이 지구 어딘가에서는 비가 멈추지 않아 강이 범람해 홍수라고 하는가 하면 또 다른 곳에서는 비가 오지 않아 식수가 모자라 큰일이라는 보도가 쏟아진다. 물론 오늘의 서울도 예외는 아니었다. 기록적인 한파 덕분에 온 도시가 난리였다. 나와 같은 녀석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하철과 버스가 모든 것을 해결해줌에도 불구하고 빌어먹을 한파니 폭우니 하는 것들 전부 고역이 될 수밖에 없다. 귀가 떨어져나갈 것 같은 추위에 지하철 역에 들어서면 좀 나아질까 했더니 <고유가 시대, 에너지 낭비를 줄입시다!>라는 뻘건 글씨가 크게 적힌 포스터가 보이면서 역사내의 난방이 꺼져있었다.
“빌어먹을 추워죽겠는데.. 내가 낭비할 에너지가 어디 있다고…”
누구든 들으라는 듯이 혼자 중얼거렸다. 코트 안 주머니에 넣어둔 교통카드를 센서 위로 스치며 2120원 밖에 남지 않은 카드 잔액을 보니 더욱 울화가 치밀었지만 서둘러 지하철 플랫폼에 들어서 신문 가판대 쪽으로 향했다. 온갖 신문들은 서로 무엇이 더 문제인가 앞다퉈 1면을 장식했다. 정면에 석장이나 연달아 걸린 신문들은 ‘이상기후, 한파로 도시 마비’, ‘기상청, 한파 예보할 수 없었다’, ‘전무후무한 기상재난 대책 미비’ 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얼어 붙은 도심 사진, 반면 북극에서는 빙산이 무너지는 사진과 익사 직전의 망연자실한 북극곰 사진이 온 신문을 도배했다.
아연실색.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신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일제히 ‘금융위기 강타, 자동차 판매량 급감’, ‘국산 자동차 내수시장마저 타격 받아..’, ‘자동차 산업 구제할 금융 구제 정책 시급’ 따위의 헤드라인을 내걸며 자동차가 팔려야 경제가 살고, 사람이 산다고들 마치 미친 전도사 마냥 두 팔 벌려 외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늦은 점심시간 나와 같은 지하철 플랫폼 위에서 어디론가 가려는 사람들은 지친 표정으로 모든 일에 무관심해 보였다. 마치 ‘Pulp’의 ‘common people’이 어디선가 들리는 것 같았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홍대 방향 전철이 도착했다. 아직 퇴근시간이 되지 않아 사람은 비교적 적었지만, 폭설로 열차 내 앉을 자리는 없었다. 실은 그다지 안고 싶지도 않았다. 유독 서울의 전철 풍경만이 그러한 느낌인지는 나로서 알 수가 없다. 허나, 전혀 모르는 이들과 삶의 지친 얼굴들을 마주 바라보면 비참한 기분이 들어 견딜 수 없다. 졸고 있는 사람, 영어 단어를 외우는 사람, pmp를 보는 사람, 종로부터 거하게 취한 노인들..
‘헬로 미스터 서울. 너란 녀석은 사람들의 휴식을 몹시도 싫어해.’
몇 분전 2120원이 남았다며 붉게 표시된 LED만이 머릿 속을 맴돌았다.
/2010년 1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