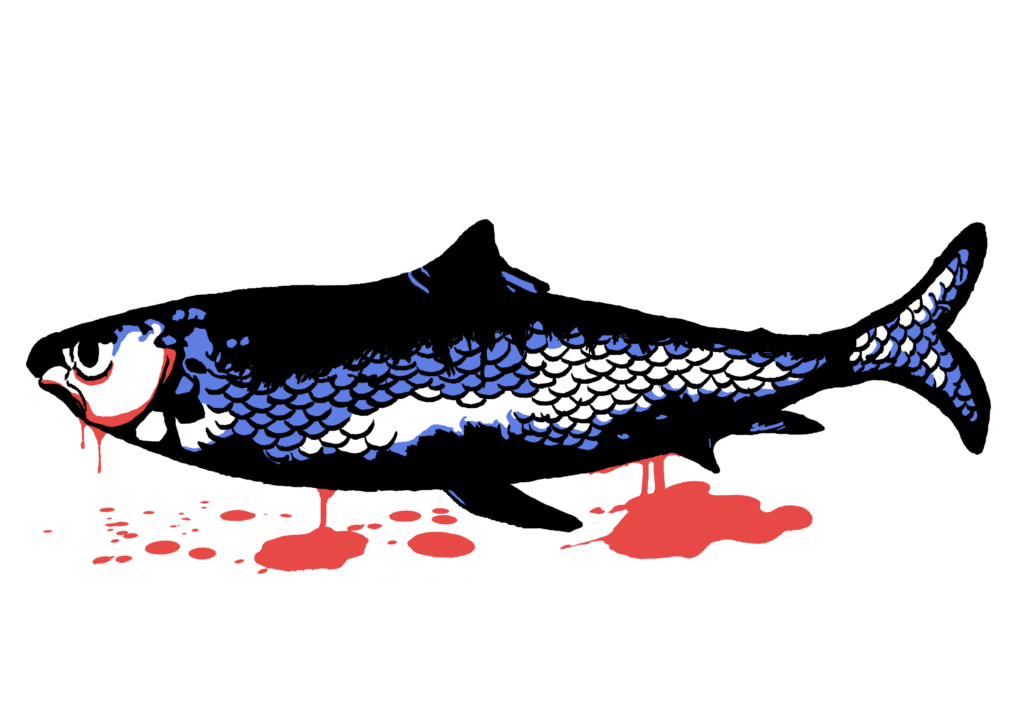
2014년 10월 23일, 그리고 2015년 5월 29일. 23일의 나는 너를 몰랐고, 29일의 나는 너를 알고 싶다. 23일은 혼자서 바 테이블 구석에 앉아 친구들의 조잘거림을 지켜보며 다가올 숙취들을 기다렸고, 29일 오늘은 차갑게 식은 백열등 너머 어둡고도 하얀 천장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창가, 벌어진 커튼 사이로 햇살이 고개를 내미는데, 나는 자꾸만 콧잔등이 시큰거려, 괜스레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커다란 쿠션에 얼굴을 부비적거린다. 차라리 몰랐으면 좋으련만, 그 달콤함을 잊을 수가 없어 아무래도 나는 너 때문에 나 스스로를 추스릴 수가 없네. 코에서 입술로 흐르는 무엇인가를 손등으로 훔치고나니, 손등 위로 붉은 피가 orchid처럼 보였다.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나는 너를 훔치고 말거야.” 숨소리가 듣고 싶다. 떨리는 손을 갖고 싶다. 내가 이렇게 좋아도 되는걸까? 그래도 되는걸까?
ㅡ 2015년 5월 29일, 오후 4시 반
“누군가에게 한없이 빛나 눈부신 이 곳이, 누군가에게는 눈조차 뜰 수 없는 지옥이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