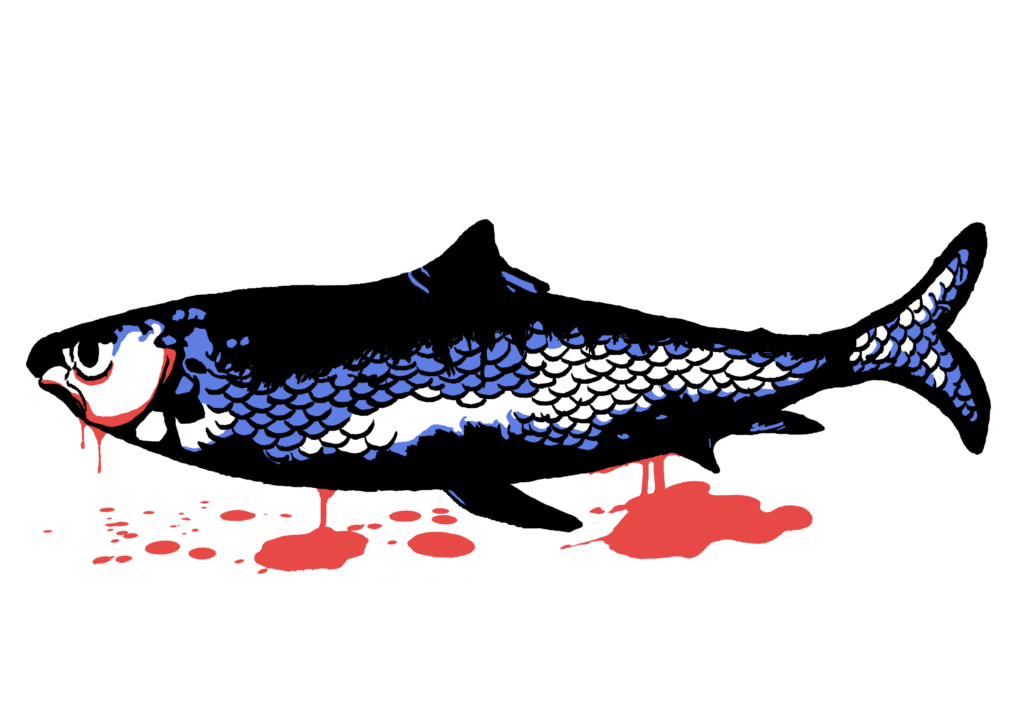
“낙후된 삶”
며칠을 집 밖서 지내다 어제 집에 돌아왔다. 씻지도 않은채 그대로 잠을 청했는데, 옆에서의 옹알거림 때문에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렵사리 병원으로 발걸음을 떼었다. 병원에서는 평소보다 부쩍 더 늘어난 환자들로 나는 1시간 가량 기다려 주치의를 만나러 진료실에 들어갔다. 주치의는 진료실에 들어선 나를 보자마자 화난 말투로 “민주씨, 다시 입원 하는게 좋겠어요.” 라며 입원 수속 관련 이야기들을 꺼냈다. 안 그래도 힘이 들었는데, 어머니 가게 소송 문제 때문에 다시 병원에 들어갈 여력이 안된다고 대꾸하니 내 얼굴을 보고 한숨을 푹 쉬더니 “왜 이렇게 병원에 오질 않느냐” 라고 물었다. 나는 잃어버린 소책자 한권에 대한 이야기로 대답을 했다. 누가 빌려간지 도통 기억할 수 없다하니 날 위로하려 했다. 주치의의 일상적인 공감시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그 위로를 나는 잠자코 듣고 있었다.
“진료 받기로 약속했던 날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후가 아버지 제사 였는데, 계속 무거웠다” 며 말을 이어갔다. “게다가 지난주 토요일에 갑작스런 이모부의 부고에 혼자 있을 수가 없어 선생님 보러 왔다” 이야기 했다. 오랜만에 주치의와 단 둘이서 이야기를 하고나니 마음이 편했다.
“병원 오는 길의 웅성거림, 그것이 힘들다” 이야기 하였다. 마지막 처방에선 아빌리파이와 수면유도제, 혈압약, 항간질제 따위들을 받았는데, 두달 넘도록 병원을 찾지 않아 힘들테니 아빌리파이 대신 리스페달로 바꾸고, 다른 약들도 줄였다가 다시 시작하자고 하셨다. 그리고 경제적 여력이 되는지 요즘은 어떻게 지내는지 내게 물었다. 나는 일 할 수가 없다. 한참 일해야할 나이의 스물 다섯의 청년에게 약을 처방해주며 주치의의 당부였다. 그 당부를 듣던 때의 어머니 표정, 왈칵 눈물을 쏟을 것 같은 눈과 꽉 깨문 입술은 아직도 잘 기억하고 있다. 주치의는 내가 장애인 등록이 되고나면면 보조금도 나오고 한결 편해질거라 말했었다.
주치의는 꼬질꼬질한 내 손을 가리켰다. 어디서 온 녀석인지 1주일 넘게 오른손 검지 손가락에 박힌채로 있던 가시가 있었다. 빼내보려고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긴 가시는 빠지지 않았다. 주치의는 진찰비와 약값을 정산하고, 1층 가정의학과에서 치료 받으라며 걱정해주었다.
진찰비, 약값 정산. 다행히도 지난 여름 주치의가 난치성 질환자로 등록해주어 진료비 2000원에 일주일치 약값 1300원만 내어도 되었다. 가정의학과의 간호사는 낯익은 얼굴이라 했더니 내가 입원했을 때 종종 보았던 얼굴이었다. 기다리는 동안 약을 받아 돌아오니 어린 아이가 변 조절을 못해 힘들어 한다며, 먼저 진료하게 하자길래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또 1시간을 기다렸다. 간호사는 내게 무척 미안해 했다. 나를 잊고서 다른 업무들을 보러 갔다 오는 길에 1시간째 기다리던 날 본것이다. 일주일간 쓰렸던 검지는 매쓰로 살을 째 4cm나 되는 가시를 빼냈다. 간호사는 어떻게 이렇게 긴 가시가 박혔는지 물었지만, 나도 알 수 없었다. 약간의 통증이 남아있긴 했지만, 손을 움켜쥐었다 펼쳤다를 반복하며 한결 편해진 손을 바라보았다.
집에 오는 길, 문뜩 오래전 이야기가 생각났다…
아버지가 떠나고 나서, 어머니는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했다고 울부짖으며 말했던 것이 이해 되기 시작했다. 그 말이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동안 가슴에 비수처럼 남아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는 나를 속이지 않으려 했던 것뿐이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ㅡ 2009년 10월 21일 밤 23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