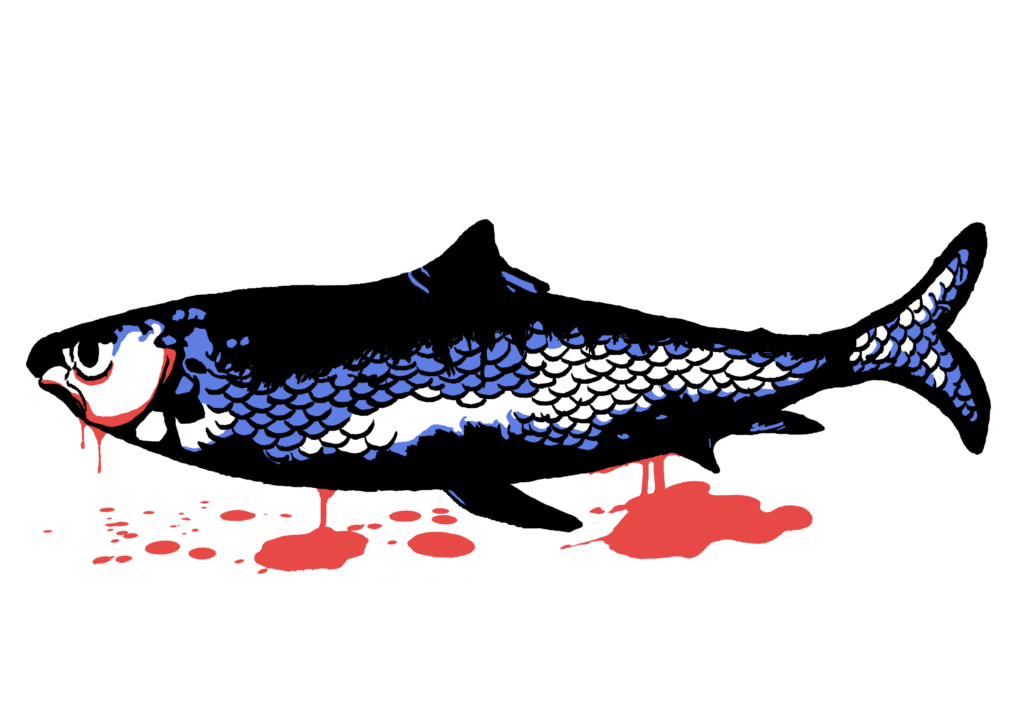
오늘은 민중의 식탁이 있었다. 초밥 100여개를 접었다.
이십유로 남짓 내밀길래, 과연 그것이 내 것일까 한참을 고민했다.
연거퍼 마시고, 또 그게 좋았다.
서너번 손을 씻었는데도
아직도 손에서 밥내, 초내가 진동을 한다.
어여쁜 이가 날더러 좋다고 한다.
“넌 그냥 그 초밥이 맛있었던거야.”
나는 초밥 좀 말았을 뿐이었는데, 이 어여쁜 이가 내게 무엇인가 주고 싶다고 하였다.
자기 방에 쟁여둔 와인 있다는 걸 뿌리쳤다.
그리고 550원짜리 맥주 하나 사달라고 하였지.
그리고 잘 얻어 마셨다.
입맞춤 없이도 썩 괜찮은 밤이었지.
일주일 전 받은 명함을 모조리 찢고 싶었는데,
그러기엔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그래봐야 서너장이기야 한데,
연락하지 않을 생각이면서도 그 명함을 깊숙히 쑤셔뒀다.
술 한모금을 들이켰다.
보고 싶으면 다시 오라고 했지.
그 사람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어제처럼 다시 마신다.
어젯밤 비로 물 웅덩이가 만들어졌고,
근사한 달이 그 위로 지났다.
그리고 아무 것도 남지 않았다.
시큰한 밤이다.
ㅡ 2014년 8월 8일 늦은 밤